이런 작전은 선진국들의 전쟁터인 첨단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는다. 선진 기업에서 가져 온 기술로 저렴하게 제품을 만드는 건 후발주자와 개발도상국에나 통하는 전략이다. 더군다나 디지털 전환과 기술 패권 경쟁이 뜨거워진 요즘이다.
세계 초일류 기술·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우수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풍부한 과학기술인력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혁신 제품을 내놓으며, 이들이 회사의 리더로 성장한다. 스타 임원 한두 명의 영입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우리는 이런 준비가 충분할까.
최근 연구자가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고 도전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이 늘었다. 2016년 1조원 안팎이던 예산이 올해 2조 5000억원이 됐다. 특히 청년과 신진연구 인력에 투자가 집중됐다. 또 과거에는 연구 본연의 일보다 덜 중요한 것, 예컨대 '증빙에 쓸 영수증에 풀칠하는데 시간을 더 쓴다, 연구결과를 논문·특허·제품이 아닌 두꺼운 서류로 대신한다'는 등 행정주의가 만연했지만, 전자영수증 도입과 부처별 시스템 통합 등 관료주의를 걷어낸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연구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혁신의 일환이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사회 다른 분야처럼 과학기술계도 청년 일자리 부족이 심각하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경쟁력 제고도 절실하다. 해외에서 기술을 배워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낸 산업계는 세계 초일류로 우뚝 섰는데, 대학·연구기관은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친다. 선진국보다 역사가 짧은 탓에 초일류까지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업보다는 긴 호흡으로 키워야 한다.
지금까지는 선진국의 뒤를 부지런히 쫓았지만, 어느 새 고개를 드니 앞서 달리는 선수가 몇 없다. 불어오는 바람을 가장 앞에서 맞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뛴다. 불안한 게 자연스럽다. 지금까지는 정답 있는 문제를 푸느라 바빴던 우리인지라 더욱 당황스럽다. 이때 가장 나쁜 해법은 '하던 대로'다. 크게 성공했던 방법은 바꾸지 않는 게 편하겠지만, '성공의 덫'에 빠진 대표 사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였다.
 |
| 정우성 포스텍 교수./사진제공=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더욱 사람에 집중하도록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선도해 나갈지는 결국 우수한 국민에게 달렸다.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던 시대는 저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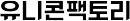








![[단독]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육·해·공군총장 참석 제외…軍 개혁 의지?](https://thumb.mt.co.kr/11/2025/06/2025060409583232699_1.jpg/dims/resize/100x/optimize/)


![[단독] 민주당, '더 세진' 상법 개정안 5일 발의..."공포 즉시 시행"](https://thumb.mt.co.kr/11/2025/06/2025060416342361489_1.jpg/dims/resize/100x/optimize/)



![[단독]전세금 26억 떼인 서현진, "23억 신고가" 이 아파트로 이사…대출 NO](https://thumb.mt.co.kr/11/2025/06/2025060223320018132_1.jpg/dims/resize/100x/optimize/)




![[단독]디올·티파니 싹 털리더니…까르띠에도 개인정보 유출](https://thumb.mt.co.kr/11/2025/06/2025060310521697390_1.jpg/dims/resize/100x/optimize/)



![[단독]"한국 오면 연봉 1억 드려요"…'美 유출' AI인재 400명 모신다](https://thumb.mt.co.kr/11/2025/05/2025053011403089280_1.jpg/dims/resize/100x/optimize/)


















![[단독]고3 김새론 남친은 '연상 아이돌'이었다…김수현 6년 열애설 실체](https://thumb.mt.co.kr/10/2025/05/2025052014034282813_1.jpg/dims/resize/100x/optimize)


!["코 막혀" 병원 갔는데 '종양'이…"HPV와 관련" 뭐길래 [한 장으로 보는 건강]](https://thumb.mt.co.kr/10/2024/12/2024120617204571583_1.jpg/dims/resize/100x/optimize)




![[더차트]한국이 밀리다니…'세계 최고의 나라' 1·2위는 스위스·일본](https://thumb.mt.co.kr/10/2024/10/2024102409034982221_1.jpg/dims/resize/100x/optimize)

![[카드뉴스]나만의 든든한 두번째 명함 '스타트업 엔젤투자자'](https://thumb.mt.co.kr/10/2024/09/2024090215454068791_1.jpg/dims/resize/100x/optimize)




![[단독] 민주당, '더 세진' 상법 개정안 5일 발의..."공포 즉시 시행"](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6/06/2025060416342361489_1.jpg/dims/resize/300x/optimize)






!['유퀴즈' 김숙, 데뷔 30주년 맞은 소회 [오늘밤 TV]](https://cdn.ize.co.kr/news/thumbnail/202506/68270_98886_1743_v150.jpg)






!["이러다 단일화 무산된다"...‘김문수vs한덕수’ 갈등에 국민의힘 비상[터치다운the300]](https://i2.ytimg.com/vi/yVLeHaT-H4Q/hqdefault.jpg)
![엄경영 "한동훈, 김문수 역전할 가능성은 OO%...한동훈 후보 되면 단일화 난항" [터치다운the300]](https://i4.ytimg.com/vi/3CUwTzWmYTw/hqdefault.jpg)
![한국은 중요한 중심축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빠르고 긴밀히 협력해야" [2025 키플랫폼]](https://i4.ytimg.com/vi/WlrIShFeNFg/hqdefault.jpg)






![[채승병 박사] 중국군 7만 해커 부대로 정보통신망부터 파괴할 것.. 첨단 정보o우주 병력만 30만명!](https://i4.ytimg.com/vi/sU1O7MFqxA0/hqdefault.jpg)
![이준석 "국민의힘과 손잡을 일 없다...옳다고 생각하는 정치 할 것"[터치다운the300]](https://i1.ytimg.com/vi/tWpmy_ErQtE/hqdefault.jpg)
![[채승병 박사] 중국군=인해전술? 시진핑 '강군몽' 위험성과 위력 간과 말아야](https://i1.ytimg.com/vi/t-xYhGfTBBY/hqdefault.jpg)




![9만원 사면 1만원 더 준다, 한병도 "이재명표 지역화폐, 어마어마"[터치다운the300]](https://i2.ytimg.com/vi/uMKjt6kf_5A/hqdefault.jpg)
![[채승병 박사] 재래식은 우위? '실전 경험' 북한과 격차 크게 줄었다](https://i3.ytimg.com/vi/FDXADte_650/hqdefault.jpg)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 많이 고민하고 있다"[터치다운the300]](https://i1.ytimg.com/vi/lnTGywXtwkM/hqdefault.jpg)
![[채승병 박사]저가형 드론 백만대로 최전선 버틴 우크라이나.. 로우테크 물량전 시대 열렸다](https://i2.ytimg.com/vi/5M0BAUDvdpU/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