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화면 갈무리. |
2020년 국민적 불만을 사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네이버, 카카오와 이동통신사의 패스 등 민간 인증서 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다수 공공서비스의 인증시스템이 과거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중심이어서 국민불편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인인증서 폐지 1년... 대법원 등 "네이버·카카오는 아직 안 돼"
 |
| /이미지=뉴스1 |
대표적인 게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이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시스템인데, 그동안 공동인증서만 사용하다 지난 7일에야 전자서명수단으로 금융인증서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용자가 많은 이통3사의 패스(PASS)나 네이버, 카카오 등의 민간 인증서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대법원 이외에 국회 역시 웹사이트도 로그인 시 본인인증 방법을 휴대폰 인증과 공동인증서, 아이핀만으로 제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검토한 결과 네이버·카카오 등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범용성과 신뢰성 등이 부족할 수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금융상품 가입 등 온라인 환경에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뜻한다. 실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 한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이 아니어도 민간 인증서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닐뿐 더러, 정부 기관이 반드시 본인확인기관이 발급한 민간 인증서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와 달리 이통3사의 경우 이미 본인확인기관인만큼 이통3사의 패스는 도입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카카오는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범용성 측면에선 훨씬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실제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자서명을 검증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
| /사진제공=카카오 |
이와관련, '자부 중심주의'가 대국민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민간 인증서를 도입한 공공 서비스는 대부분 행정부 관할 서비스인 반면, 국회는 입법부, 대법원은 사법부 관할이다. 디지털정부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 결정에 행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없다"며 "관련 법에 따라 이들 기관은 국회규칙과 대법원 규칙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IT(정보통신) 업계 관계자는 "사법부, 입법부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인데, 자부의 이해관계와 운영 편의 탓에 국민 불편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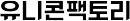












![[속보]이재명 대통령 "지역에 인센티브 필요...해수부 부산 이전 상징적 조치"](https://thumb.mt.co.kr/11/2025/07/2025071414094363040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상] 케이팝데몬헌터스 속 '갤럭시 까치'…삼성 언팩에 뜰까](https://thumb.mt.co.kr/11/2025/07/2025070909425984260_1.jpg/dims/resize/100x/optimize/)







![[연중기획] ESG시대, 착한 기업만 살아남는다.](https://thumb.mt.co.kr/06/2025/07/2025070912320790948_2.jpg/dims/resize/300/crop/300x198!/optimize/)








![의대생들 드디어 돌아온다…"정부·국회 믿고 전원 학교 복귀"[전문]](https://thumb.mt.co.kr/10/2025/07/2025071220413210174_1.jpg/dims/resize/100x/optimize)





![[단독]고3 김새론 남친은 '연상 아이돌'이었다…김수현 6년 열애설 실체](https://thumb.mt.co.kr/10/2025/05/2025052014034282813_1.jpg/dims/resize/100x/optim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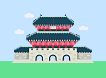





![[단독] 소시 태연도 김태연도 '황당'..."한우 축제 출...](https://cdn.ize.co.kr/news/thumbnail/202507/69162_100818_825_v150.jpg)









![[채승병 박사] 재래식은 우리가 낫다고? 북한 실전경험 자체가 너무나 위협적!](https://i4.ytimg.com/vi/WXbcRA0AUm4/hqdefault.jpg)
![대선 패배 국민의힘, 한동훈·친윤·김문수·안철수…당권 어디로?[터치다운the300]](https://i4.ytimg.com/vi/chobolIWE0c/hqdefault.jpg)
![[채승병 박사] 중국군 7만 해커 부대로 정보통신망부터 파괴할 것.. 첨단 정보o우주 병력만 30만명!](https://i4.ytimg.com/vi/sU1O7MFqxA0/hqdefault.jpg)
![이준석 "국민의힘과 손잡을 일 없다...옳다고 생각하는 정치 할 것"[터치다운the300]](https://i1.ytimg.com/vi/tWpmy_ErQtE/hqdefault.jpg)





![한동훈이 윤석열에 한 것처럼?...서영교 "여당 대표,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해야"[터치다운the300]](https://i3.ytimg.com/vi/6TI1mhRlP0g/hqdefault.jpg)

![30대 중반에 잠 못 자고 40km 행군하면 벌어지는 일 [김기자의 밀리터리 인턴] | 해병대편](https://i4.ytimg.com/vi/KvO4OkP93x4/hqdefault.jpg)






![[채승병 박사] 중국군=인해전술? 첨단 정보o우주 병력만 30만명!](https://i4.ytimg.com/vi/3qYX3s8LztA/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