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축구대표팀이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2회 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달성한 대표팀 김학범 감독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축구감독의 역할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알렉스 퍼거슨(77)이다. 27년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를 이끌며 38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린 축구감독의 전설은 “축구에서 99%는 선수고, 감독은 1%다. 하지만 그 1%가 99%를 지배한다”고 했다. 감독 역할의 중요성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다. 감독의 선수 선발과 훈련, 전술에 따라 경기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게 1%가 99%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다.
이영표(41) KBS해설위원은 거스 히딩크(네덜란드)가 왜 명장인지는 이렇게 설명했다. “에인트호번 시절 히딩크 감독은 경기를 앞두고 3~5분짜리 스피치를 했다. 그걸 들으면 잔잔했던 마음이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뀐다. 단지 스피치가 좋은 게 아니라 평소 교감이 형성돼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다.”
결국 선수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아무렇게나 뽑을 수도 없고, 또 뽑힌 뒤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감독이다.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김학범(58) 감독의 리더십이 조명 받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대회기간 내내 선수들의 멘탈을 지배했다. 일본과의 결승전을 앞둔 선수들에게 딱 한마디를 했다. “일장기가 우리 태극기 위에 올라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두 눈 뜨고 그 꼴을 못 본다.” 민족적인 감정을 극적으로 활용한 명언이다. 이 한마디에 선수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죽어야겠다는 투쟁심이 생겨났을 것이다.
이런 동기부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먼저 신뢰가 깔려 있어야한다. 지난 한달을 되돌아보면 김 감독의 리더십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황의조.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선수선발부터 인맥축구 논란으로 불신이 팽배했다. 대회전까지도 비난이 난무했다. 하지만 그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황의조의 선택은 전적으로 팀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황의조가 골 퍼레이드를 펼치며 자신의 진가를 발휘한 건 감독의 믿음 덕분이다.
조별라운드 말레이시아전에서 패한 뒤에는 자신의 실수를 깔끔하게 인정했다. 그리곤 전술적인 유연함으로 그 위기를 넘겼다. 그는 평소에도 “고집만 부려서는 팀을 운영할 수 없다. 늘 변해야 산다”고 했다. 이는 충격적인 패배 이후 3백에서 4백으로 과감한 변신이 가능했던 이유다.
가장 큰 고비는 우즈베키스탄과 8강전이었다. 연장혈투 끝에 4-3으로 이겼지만, 감독은 소집 이후 처음으로 화를 냈다. “간절함이 부족했다”는 게 꾸짖음의 이유다. 이런 분위기 변화를 통해 선수단을 다 잡는 효과를 봤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감독이 흐름을 주도한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다. 최근 벌어진 국제대회에서 가장 극적인 우승을 만들어낸 김 감독의 리더십은 여러모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확고한 신념과 선수단 장악력, 그리고 유연한 전술적인 대응은 축구를 가르치는 모든 감독들에게 시시 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그를 ‘학범슨’(알렉스 퍼거슨을 비유해 붙인 별명)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hg2@donga.com·체육학 박사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0
공유하기







![재계약 앞둔 있지, ‘연대’에 담은 미래 스포? ft.갈비뼈 투혼 (종합)[DA:현장]](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06/09/131769416.1.jpg)




![웅탄일 기념으로 1500만 원 기부…임영웅 팬들의 진짜 영웅력[★1줄컷]](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06/09/131766172.1.jpg)
![강혜원, 포크 하나로 완성한 셀카의 정석[★스느스]](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06/08/13176321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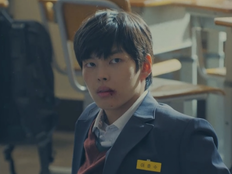






![이혜영, 벗었더니 처참한 뒤태 “그림이 나에게 주는 선물들”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06/08/131761014.1.jpg)
![티아라 지연, 폭주하는 돌싱 근황…온몸이 꽃 문신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06/07/131760155.1.jpg)
![25살 김유정 비키니 이 정도였어? 성숙미 물씬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06/08/131760934.1.jpg)
![42세 김민정, 민낯보다 놀라운 운동복 자태 ‘탄탄 S라인’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06/08/131761194.1.jpg)




![’62세‘ 황신혜, 스페인서 포착…놀라운 비키니 자태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5/06/09/131769580.1.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65억 건물주’ 강민경 월이자 1600만원이지만, 지칠 정도로 예뻐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18/131628823.1.jpg)


![엄지인 100년 된 가보 감정가 대충격…현장도 발칵 (사당귀)[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05/131544757.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