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의 집]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따뜻한 위로 - 머니투데이](http://thumb.mt.co.kr/06/2018/08/2018082320463258825_2.jpg/dims/optimize/) |
가난했던 유년을 함께한 가족에게 향하는 시인의 시선에서는 더 진한 안타까움이 묻어난다. 대물림된 가난으로 중년의 삶에도 여전히 가난한 가족, 특히 누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선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 서정시가 지향하는 감동이 외적인 것을 내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라면 그의 시는 이미 그 이상을 함의하고 있다.
비행선이 뜨고
차양을 눌러 쓴 가을꽃들이 물결처럼 찰랑거린다
축제 모퉁이 앞치마를 끌리듯 입은 당신은
찬물에서 국수를 건져 올린다
수육 솥에 불을 지피고 잔칫상 얼룩을 닦는
작은 손등이 부어 보인다
축제가 붉어지고 몰고 가는 가락이
낭창낭창 휘어지면 초원식당 파전이 익어간다
탁자 사이를 오가는 쟁반 위로 술에 불어터진
저녁이 쏟아진다
지상에서 쏟아붓는 색색의 불꽃들
당신은 발가락에 물집이 잡혀 있다
기댈 벽이 없어서 울 수도 없는 작은 여자가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그릇을 씻는다
아줌마 손님
축제 밖에서 재빨리 컵을 챙기는
만지작거리면 글썽이는 이름
누님, 당신이 뒤돌아본다
- '초원식당' 전문
"비행선"이 떠 있는 어느 축제마당을 찾은 시인은 초원식당 앞에서 누님을 바라보고 있다.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누님을 관찰한다. 축제 한 모퉁이에서 "앞치마를 끌리듯 입"고 "찬물에서 국수를 건져 올"리는 누님. 시인의 시선은 "수육 솥에 불을 지피고 잔칫상 얼룩을 닦는/ 작은 손등"에 머문다. 누님의 손등이 부어 보인다. 시인은 바쁘게 움직이는 누님에게 다가가지 못한다. 파전을 만드는 누님의 "발가락에 물집이 잡혀 있"어도 지켜만 보고 있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누님이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그릇을 씻"을 때에야 비로소 "누님"하고 부른다. 목소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다. "기댈 벽이 없어서 울 수도 없는 작은" 누님이 뒤를 돌아보지만 시인은 더 이상 시상을 전개하지 못한다. "웃는 얼굴이 더 슬퍼 보일 때가 있"('누님의 꽃밭')음을, "지붕 아래 세상은 절반이 눈물"(이하 '박꽃')임을 익히 알고 있는 시인은 누님의 뒷모습에서 "서러운 빛"을 읽어낸다.
감나무 그늘 해거름이 의자에 매여져 있다
살 닿고 싶은 누군가 기다려지는 시간
그늘 몇 장 앉혀 놓고 의자는
흔들림에 대한 얘기 들려주는 것 같다
누군가 이곳에 앉아 생각을 흔들어서
푸른 산 우듬지로 우주의 아랫도리에 밑줄을 긋고
그 아래에서 도지는 알몸 같은 것들의 신음을
받아 적은 것도
산수유 붉은 알갱이로 모이는 햇살을 받아
무너진 흙벽에 발라주며 살구꽃 계절 꺼내 든 것도
여기 앉아서다
어둠이 짙어져서야 찾아드는 빛의 탯줄 기다리는 곳
뼈마디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삶과 죽음 흔들어 매만지던 손길도 여기 있다
방죽을 밝히던 연꽃이 지고 탱자나무 눈물 둥그러질 때
검은 차가 빠르게 지나간다
칠이 벗겨진 채 숨을 멈춘 흔들의자
감잎 몇 장 덮여 있다
어떤 무게로도 흔들 수 없는 붉은 적막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 '흔들의자' 전문
'흔들린다'는 말은 안락과 불안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다. 불안은 젊음을, 안락은 늙음을 상징하지만 시간의 연속성보다는 누군가의 부재에 기인한 불안과 안락이라 할 수 있다. 해가 질 무렵, "감나무 그늘"에 흔들의자가 놓여 있다. 흔들의자에 나와 있는 시간은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이 아닌 잠을 자거나 생각을 하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다. 누군가 나와 앉아 있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그늘 몇 장" 앉아 있다. 와서 쉬어야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따스했던 안락의 체온은 급격히 불안의 체온으로 식어간다. "이곳"과 "여기"라는 공간적 배경은 흔들의자 주인의 생사고락(生死苦樂)이지만 결국 흔들의자 자신의 생멸(生滅)의 시공간인 것이다. 주인 잃은 흔들의자를 바라보던 시인의 입에서 "알몸 같은" 신음이 흘러나온다. "삶과 죽음 흔들어 매만지던 손길"에서는 피붙이의 정(情)마저 느껴진다. "검은 차가 빠르게 지나"가고 난 후, "칠이 벗겨진 채 숨을 멈춘 흔들의자"에 "감잎 몇 장 덮여 있"음은 흔들의자의 주인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났음을 암시한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어떤 무게로도 흔들 수 없는 붉은 적막"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눈 쌓인 등성이로 곤줄박이 한 쌍이 날아든다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포롱포롱 날다가
갑자기 내 얼굴을 스치듯 지난다
손바닥을 내밀자 깃털 같은 생이 내려앉는다
손바닥에 감기는 차가운 감촉
어느 돌 틈 겨울을 밟고 온 듯하다
덤불 속 말라비틀어진 허기 몇 개 뒹구는
저들의 집도 추웠나 보다
움켜쥐고만 살아온 이력이
내 손바닥에 숱한 금으로 새겨져 있다
목을 비틀고 깃털을 뽑던
상한 것들의 얼룩이 배어 있는 손바닥으로
주저 없이 날아들어 콕콕 쪼아대는
바람 같은 목소리
새의 부리가 찍어놓은 손바닥 점자들을
우둔한 나로서는 읽을 수가 없다
다만 두리번거리던 발목 하나에 내밀었던 기억이
손바닥에서 자라나
무수한 실금으로 뿌리 내리고 있다
- '만남' 전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시는 사람이 아닌 새와의 만남을 통해 연민과 사랑, 공감을 그려내고 있다. "눈 쌓인 등성이로 곤줄박이 한 쌍"이 먹이를 찾기 위해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포롱포롱" 날아다닌다. 시인이 손바닥에 먹이를 올려놓자 "곤줄박이 한 쌍"이 날아와 먹이를 먹는다. 사람과 새가 하나되는 아름다운 풍광이지만 그 이면에는 배고픔의 공포가 존재한다. 배고픔은 사람에 대한 공포나 경계를 넘어선다. 어린 시절 가난을 경험한 시인은 손바닥에 올려놓은 먹이를 먹는 새의 부리보다 "차가운" 발에 초점을 맞춘다. 겨울산행인지라 손이 차가울 텐데, 새의 발은 더 차가웠던 것. 새의 차가운 발은 "덤불 속" 새의 보금자리에 가 닿는다. "저들의 집이"가 아니라 "저들의 집도"라고 한 것은 (어린시절) 시인의 집 또한 새의 집과 마찬가지로 춥고 배고팠다는 것을 환기하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새가 "움켜쥐고만 살아온 이력"과 "내 손바닥에 숱한 금"은 새와 시인이 서로 공감하는 영역이지만 "새의 부리가 찍어놓은 손바닥 점자들"을 다 해독할 수는 없다. 그것은 사람과 새의 언어와 삶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두리번거리던 발목 하나에 내밀었던 기억"은 연민을 넘은 공감, 살아 있는 것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건강한 연대를 이룰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어둠으로 동여맨 밤
밖으로 불거진 불빛이 곱다
밤의 무게를 가볍게 덜어내고
들어앉은 몇 평의 공간
불빛에 기대어 사는
어묵 냄새가 골목을 밝힌다
어둠 속 가을 나무 이파리 같은
사람들이나
버스 터미널 혼자 돌아설 때
우물우물 씹던 눈물도
이곳에서는 다 하나가 된다
둥글게 데워진다
노동의 지친 하루가 골목 깊숙이 따라오는
저녁
모퉁이를 돌아서면
저렇게 뽀얀 불빛만으로도
따뜻한 위로가
- '포장마차' 전문
이 시에서 주목할 점은 포장마차가 화합과 치유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포장마차는 "골목 깊숙"한 곳에 "들어앉은 몇 평의 공간"이지만 삶의 "무게를 가볍게 덜어"낼 수 있는,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다. 포장마차에서는 "어둠 속 가을 나무 이파리 같은/ 사람들이나/ 버스 터미널 혼자 돌아설 때/ 우물우물 씹던 눈물도" 다 치유된다. "어둠 속에서 잘려 나간 상처를 다른 살로 덮"('뭉툭한 손목')고도 남는다. 다 같은 처지이므로,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위로"가 된다. 포장마차에서 서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어울려 술 한 잔 마신 시인은 비로소 "발끝까지 오래 따뜻할"(이하 '염문') 길을 걷는다. 시인은 이제 "소나무 푸른 산길"을 벗어나 "어지럽게 엉켜 있는 잡목 숲"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갈 것이다.
◇편안한 잠=박수봉 지음. 시산맥 펴냄. 146쪽/9000원.
![[시인의 집]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따뜻한 위로 - 머니투데이](https://thumb.mt.co.kr/06/2018/08/2018082320463258825_1.jpg/dims/optimiz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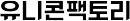















![[단독]MG손보 영업정지 불똥, 새마을금고 비대면 전세대출 막혔다](https://thumb.mt.co.kr/11/2025/05/2025053014152151457_1.jpg/dims/resize/100x/optimize/)






























![[단독]몸 떨던 푸바오 어디에?…방사장에 다른 판다→또 건강이상설](https://thumb.mt.co.kr/10/2025/01/2025010211441894356_1.jpg/dims/resize/100x/optimize)










![[속보]이재명 "실천으로 성과 만들어온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 이재명에 맡겨달라"](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6/06/2025060209210723228_1.jpg/dims/resize/300x/optimize)











!["이러다 단일화 무산된다"...‘김문수vs한덕수’ 갈등에 국민의힘 비상[터치다운the300]](https://i2.ytimg.com/vi/yVLeHaT-H4Q/hqdefault.jpg)
![엄경영 "한동훈, 김문수 역전할 가능성은 OO%...한동훈 후보 되면 단일화 난항" [터치다운the300]](https://i4.ytimg.com/vi/3CUwTzWmYTw/hqdefault.jpg)
![한국은 중요한 중심축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빠르고 긴밀히 협력해야" [2025 키플랫폼]](https://i4.ytimg.com/vi/WlrIShFeNFg/hqdefault.jpg)






![[채승병 박사] 중국군 첨단 정보o우주 병력만 30만명.. 7만 해커 부대로 정보통신망부터 파괴할 것](https://i4.ytimg.com/vi/sU1O7MFqxA0/hqdefault.jpg)
![이준석 "국민의힘과 손잡을 일 없다...옳다고 생각하는 정치 할 것"[터치다운the300]](https://i1.ytimg.com/vi/tWpmy_ErQtE/hqdefault.jpg)
![[채승병 박사] 중국군=인해전술? 시진핑 '강군몽' 위험성과 위력 간과 말아야](https://i1.ytimg.com/vi/t-xYhGfTBBY/hqdefault.jpg)




![9만원 사면 1만원 더 준다, 한병도 "이재명표 지역화폐, 어마어마"[터치다운the300]](https://i2.ytimg.com/vi/uMKjt6kf_5A/hqdefault.jpg)
![[채승병 박사] 재래식은 우위? '실전 경험' 북한과 격차 크게 줄었다](https://i3.ytimg.com/vi/FDXADte_650/hqdefault.jpg)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 많이 고민하고 있다"[터치다운the300]](https://i1.ytimg.com/vi/lnTGywXtwkM/hqdefault.jpg)
![[채승병 박사]저가형 드론 백만대로 최전선 버틴 우크라이나.. 로우테크 물량전 시대 열렸다](https://i2.ytimg.com/vi/5M0BAUDvdpU/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