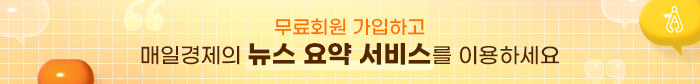이틀간 혼자 레이캬비크 시내를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묵고 있던 호텔 일식당에서 우연히 한자가 쓰인 액자를 봤다. 카운터에 앉은 중년 여성이 아무래도 한국인 같아 말을 건넸더니 맞았다. 우리 대화를 듣고 안에서 그녀의 남편이 나왔다. 다짜고짜 자기 집으로 잡아끌었다. 당시 아이슬란드 유일의 교포 김태철 사장이었다.
부부는 독일에서 광부와 간호사로 일하다 20년 전에 이주했다. 열두 살 딸과 일곱 살 아들을 두고 있었다. 김 사장 가족은 한국 선수단이 참가한 사실을 비로소 전해 듣고 다음날부터 훈련장에 와서 살다시피 했다. 김 사장이 모는 코롤라 승용차를 타고 아이슬란드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녔다. 그 후 세계 곳곳을 여행해 봤지만 거기만큼 쨍하고 선명하게 와닿는 풍경을 만나지는 못했다. 검붉은 화산재로 덮인 광활한 평야는 가도 가도 끝이 없었다. 유황 냄새를 풍기며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느닷없이 수십 m씩 물줄기를 뿜어내는 간헐천(geyser)은 그곳에서 저장된 모든 기억의 색인이다.
그중엔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시려오는 기억이 있다. 김 사장의 초등학생 아들이 흘린 눈물이다. 남자 핸드볼 간판스타 윤경신 선수를 비롯한 선수단을 졸졸 따라다니며 귀여움을 독차지한 마스코트였다. 같은 색깔의 머리와 눈동자, 같은 말을 쓰는 한국인 형들을 생애 처음 만난 것이었다. 떠나는 날 오전 내내 울먹울먹하더니 공항 출국장에서 기어이 목 놓아 서럽게 울어버렸다. 몇몇 선수들도 그 모습에 눈물을 훔쳤다. 춥고 황량한 나라였기 때문에 같은 핏줄의 정이 더 애틋했을까. 그때만큼 짠한 석별이 없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