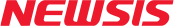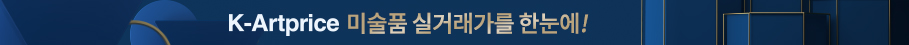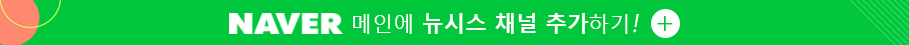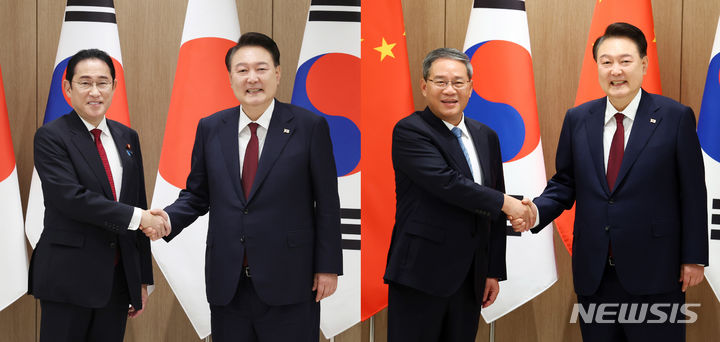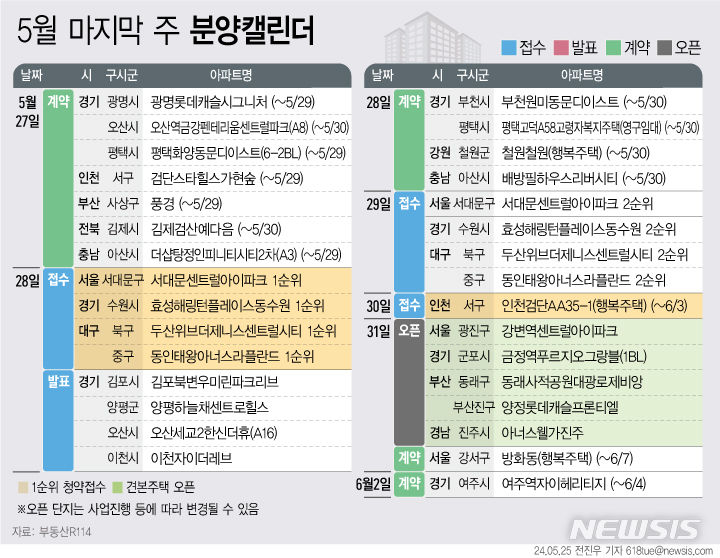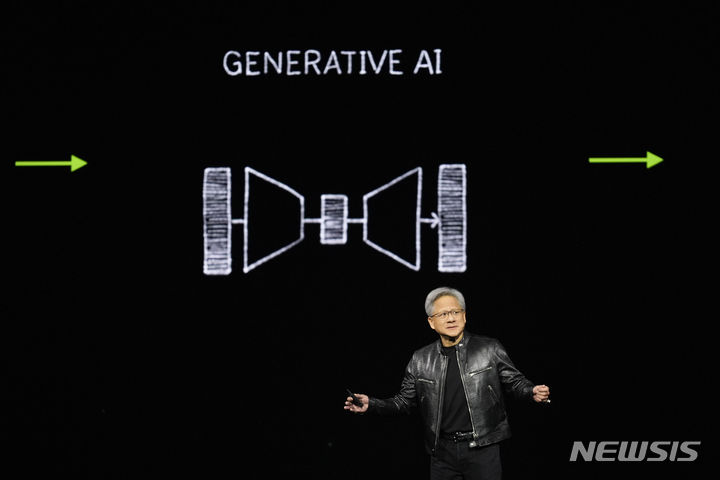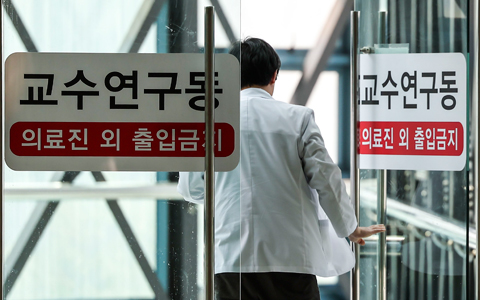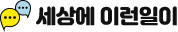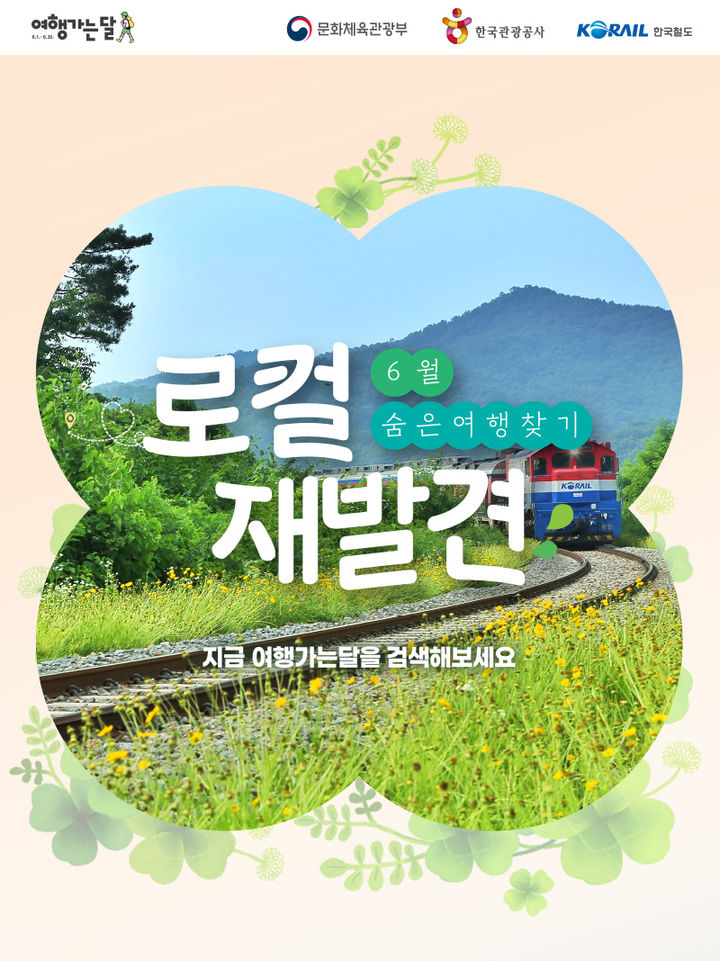'김기덕 영화' 라캉 정신분석으로 비평···'사랑의 내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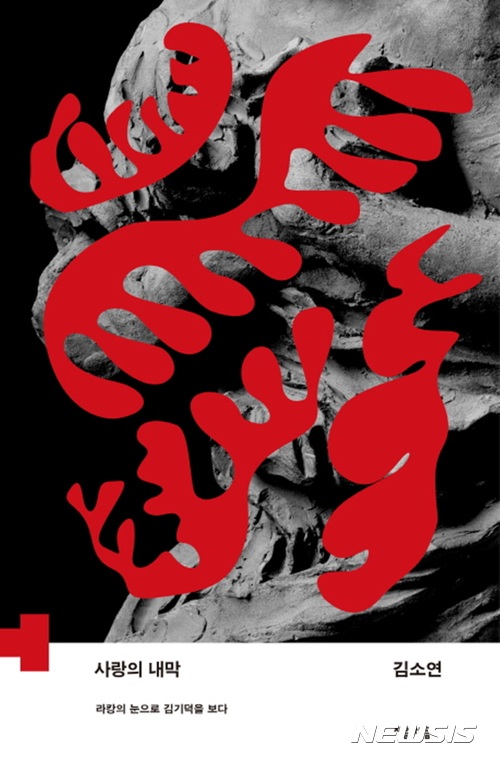
김소연씨가 '사랑의 내막'을 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1901~1981)의 정신분석학적 관점, 그 중에서도 후기의 관점에 입각해 김기덕 감독의 영화들을 세밀하게 비평한 책이다.
라캉의 정신분석의 최종 귀결점은 대타자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된 주체가 구가하는 '사랑'의 윤리를 밝히는 것이다. 김기덕 영화의 일관된 문제의식 역시 자유로워진 주체들이 어떻게 서로의 결여를 받아들이고 사랑에 이르는가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라캉과 김기덕의 우연한 만남은 그들이 추구한 가치의 일치와 더불어 필연이 된다.
크게 3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자크 라캉의 예술론에 입각해 새로운 영화 이론을 제시했다. 또 라캉의 정신분석적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그 눈으로 김기덕 감독의 주요 영화를 바라보고 비평했다. 포스트 시대를 관통해온 1990년대 이래의 한국 사회에서 왜 사랑의 윤리가 긴요한 덕목으로서 요청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라캉에 따르면 욕망은 결여로 인해 발생한다. 그 결여의 자리를 채우리라 기대되는, 그렇기에 결여의 구멍을 가리면서 동시에 가리키는 것이 바로 대상 a다. 대상 a가 욕망의 대상이자 원인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기덕 영화에서 푸른 색으로 감싸인 모든 것이 시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욕망의 미장센이다. 때로 푸르스름한 새벽 시간이나 푸른 물속 같은 공간의 재현이 비현실 또는 탈현실의 차원으로서 이동처럼 느껴지는 것도 욕망의 구현이란 본래 자신의 현실에는 부재하는 것에 도달하려는 안간힘이기 때문이다."(69쪽)
"모든 질문은 늘 대답을 안고 있다. 김기덕 영화의 윤리적 자문자답, 그 화두는 한 마디로 '사랑'이었다. 그가 이 화두를 공그르는 방식은 한편으로는 익숙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낯설었다. 익숙함은 그 화두가 남녀상열지사의 상투성 혹은 통속성을 경유하여 던져진 탓이고 낯섦은 그것이 하필이면 1990년대 중후반의 한국 사회라는 미궁 속으로 던져진 탓이었다."(11쪽)
저자는 "애초에 이 책의 가제는 '라캉과 김기덕, 그리고 (불)가능한 사랑'이었다"며 "사랑이 어떻게 불가능한 동시에 가능한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그 불가능성과 가능성에 (무의식적으로) 참여하는지, 그 차이가 어떻게 개인의 사적 경험을 넘어 사회구조적 경험의 차원에서도 작동하는지를 살피는, 요컨대 이 책은 그런 책이었으면 싶었다"고 말했다.
"계급, 인종, 성별, 세대, 지역 사이의 적대가 날이면 날마다 선량한 인간들을 괴롭히는 시대에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고도 어렵다. 뻔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뻔뻔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이야말로 교조주의자의 상투어이거나 투쟁하지 않는 자의 자기변명이기를 넘어 적대를 극복할 가장 고통스러운 전략일 수 있고 또 그래야 하지 않을까. 결여와 결여의 만남으로서의 사랑은 자기 자신의 가장 깊숙한 밑바닥을 헤집어야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312쪽, 자음과모음, 1만6000원.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