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vs페북 뉴스·콘텐츠 최강 가리자..한판 승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뉴스·콘텐츠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구글은 앱 메인화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 뉴스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뉴스피드' 서비스를 개편했다.
구글이 개인화된 뉴스피드를 내놓으면서 페이스북과 뉴스·콘텐츠 플랫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페이스북이 콘텐츠 유료화라는 카드를 꺼내든 반면 구글 뉴스 피드 개편은 뉴스 활용도만 높여 언론사 반발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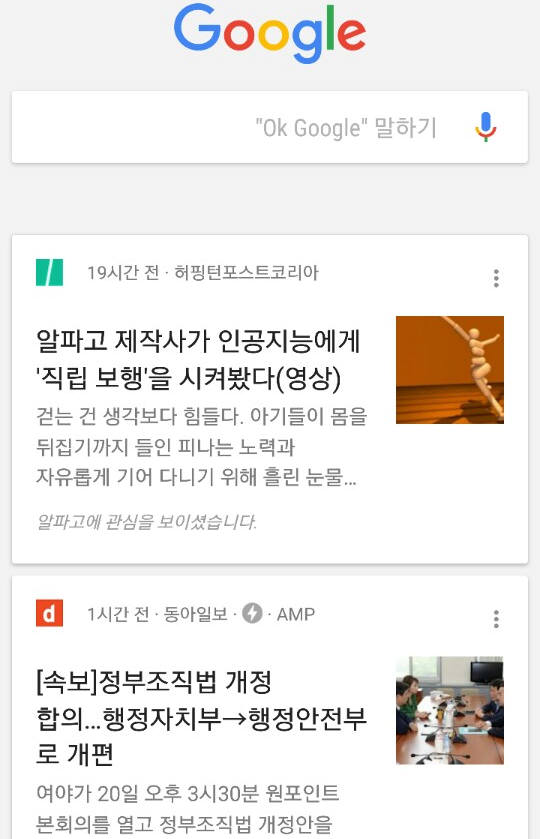
구글과 페이스북이 뉴스·콘텐츠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구글은 앱 메인화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 뉴스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뉴스피드' 서비스를 개편했다. 페이스북은 뉴스 콘텐츠에 유료 구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미국 내 언론사의 수익 확대 요구와 맞물려 누가 주도권을 쥘지 주목된다.
구글은 19일(현지시간) 구글 앱 메인화면에 개인화된 뉴스피드(News Feed)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자 개인 취향을 분석해 맞춤형 뉴스, 인물 정보 등 콘텐츠를 추천한다. 영화, 스포츠팀, 인물 등 특정 주제 검색 결과에서 검색어를 '팔로'하도록 버튼을 삽입했다. 이용자는 팔로우 기능을 활용해 관심사별 뉴스를 자동 추천받는다. 팩트 체크된 기사를 포함, 서로 다른 언론사의 기사가 표시된다. 이용자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AI 방법론인 기계학습(머신러닝) 방식을 활용했다. 검색결과뿐 아니라 지도·G메일·유튜브 등 다른 구글 서비스 이용 정보까지 활용해 추천한다. 안드로이드와 iOS 앱 모두 적용된다. PC용 웹사이트 메인 화면도 조만간 개편을 실시, 뉴스피드를 도입한다.
구글이 개인화된 뉴스피드를 내놓으면서 페이스북과 뉴스·콘텐츠 플랫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구글 뉴스피드는 페이스북 뉴스피드와 겉모습이 유사하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달리 이용자 본인에 맞춘 콘텐츠를 추천하는 점이 다르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지인이 공유하거나 이용자가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를 함께 표시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구글이 새 뉴스피드를 선보이며 페이스북과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친구가 올린 링크에 의존하는 반면 구글 뉴스 피드는 친구의 취향이 아닌 이용자에게 맞춘 정보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페이스북도 서비스 내 유료 뉴스 구독 모델 도입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포천 등 외신들은 이날 캠벨 브라운 페이스북 뉴스 파트너십 수장의 말을 인용해 10월부터 페이스북이 뉴스 유료 구독 모델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독자가 한 달에 10건 이상 기사를 읽으면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유료 구독 가입을 요청하는 형태가 예상된다. 수익성을 높여 더 많은 콘텐츠 공급자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구글과 페이스북 모두 뉴스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지만 방향은 다르다. 미국 '뉴스 미디어 연합(NMA)'은 최근 구글과 페이스북에게 정당한 수익 배분을 요구하며 단체 협상에 들어갔다. NMA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사 2000여곳이 모인 단체다. 온라인 플랫폼이 뉴스를 이용해 막대한 광고 수입을 올리면서 제값을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이 콘텐츠 유료화라는 카드를 꺼내든 반면 구글 뉴스 피드 개편은 뉴스 활용도만 높여 언론사 반발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뉴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AI를 활용한 맞춤형 추천을 시작할 경우 구글을 통한 뉴스 소비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구글은 뉴스피드에 광고 삽입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다수 현지 매체들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소벤처기업부 시대 열린다..미래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 [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행자부, 4년만에 행정안전부로 개편..국민안전처 3년만에 폐지
- 네이버 AI 스피커 웨이브, 일본 예약 닷새 만에 완판
- 삼성전자 AI비서 '빅스비' 전용 이어셋 개발 착수
- 'IoT를 쉽고 빠르게' KETI, IoT 플랫폼 '모비우스 2.0' 공개
- '계절가전 호황' 상반기 가전내수 8% 판매증가..2년 연속 성장 청신호
- 애플, 플렉시블 OLED 자체 개발..대만에 2.5세대 R&D라인 구축
- 해경 LTE 통신망 구축..무전시장 격변 예고
- [미래기업포커스]카페24, 한국판 '쇼피파이' 꿈꾼다..연거래액 6조원 돌파 기대
- 엘앤에프, 이차전지 핵심 소재 양극재 공장 증설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