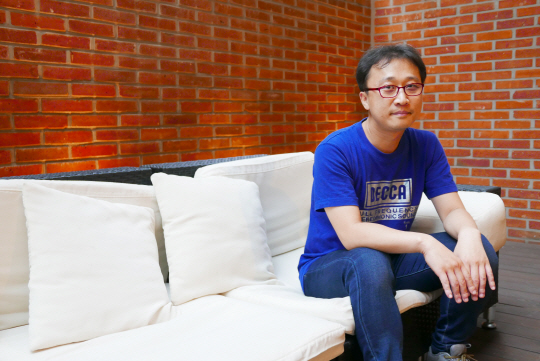[책♥사람]포털 웹 사전 기획자가 쓴 우리 시대 사전 뒷얘기들
정철 지음, 사계절 펴냄
|
사전과 사전 편찬자들은 사라져가는 유물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가 몹시 궁금했던 사람이 있다. 6명의 사전 편찬자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이를 ‘최후의 사전 편찬자들’(사계절 펴냄)이라는 책으로 묶어낸 정철(사진) 씨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국내를 대표하는 포털 네이버, 다음에서 20년 가까이 웹 사전을 기획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어찌 보면 종이사전의 입지를 뒤흔든 원흉이 알아서 적진으로 들어간 셈이다. 그런데도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이들은 없었다. 평소에도 정 씨가 사전 만드는 이들을 부지런히 만났던 탓이다.
|
그가 만난 이들은 50년간 사전을 만든 조재수 겨레말큰사전편찬위원장, 한국 백과사전 전성기를 이끌었던 장경식 한국브리태니커 대표, ‘뉴에이스 국어사전’ 등을 만든 안상순 금성출판사 사전팀장, 일본 헤이본샤에서 ‘서양사상사전’ ‘세계민족문제사전’ 등을 기획·편집했던 류사와 다케시 교수 등 총 6명의 사전편찬자들이다.
이들의 고민을 엿보는 것도 흥미롭지만 특히 웹 사전 기획자와 종이사전 편찬자들의 건설적인 토론이 가히 볼거리다. 정철 씨는 “국가가 어문 정책과 사전 편찬 양쪽에 지나치게 깊이 개입하고 한국어 사용자들은 이를 마치 지켜야만 하는 법인 양 받아들이는 한국의 현실에 다소 불만이 있다”며 “이번에 만나본 편찬자들은 ‘규범’이라는 건 필요하지만 하나의 표준만 인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사전들이 등장해 여러 개의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 내게도 생각할 거리를 안겨줬다”며 웃었다.
그의 비판은 국가 중심의 어문 정책을 주도하는 국립국어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사전을 활용하면서도 정작 사전산업 발전에는 돈을 쓰지 않는 포털들 역시 그는 편찬자들을 앞에 두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는“사전 편찬자들이 포털에 좀 더 많은 자본을 쓰고 사전 발전에 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포털 역시 좋은 사전이 없다면 서비스 수준도 나아질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단지성의 산물로 여겨지는 위키백과에서도 권력에 의해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편향의 강도가 종이사전 시대보다 세졌다는 지적 역시 흥미롭다. 정 씨 역시 위키백과를 개인 노트처럼 활용할 정도로 열혈 편집자에 속하지만 위키백과의 한계도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정 씨는 “언중의 언어와 관점을 담은 사전으로서 위키백과가 입지를 굳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만드는 사전은 아직 없다”며 “사전만큼은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는 다당제 형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책을 내면서 그에게 남은 것은 ‘사전 편찬자’로서 소속감이다. 늘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에 서 있던 자신이 조금은 종이사전 편찬자들과 한 부류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나. 또 한 가지 소득은 일본 사전을 그대로 베꼈던 우리의 과거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누구도 입 밖에 내기 꺼렸던 진실이죠. 어디까지 베꼈는지 잘못 베낀 건 뭔지, 지금이라도 고쳐야 할 건 뭔지 논의하는 게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이죠.”
다음 책은 무엇이 될지 기약하지는 않았지만 꿈은 하나 생겼다. 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변천사 사전을 내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개인이나 학계 수준을 넘어선 대규모 프로젝트다. 정 씨는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주도하고 다양한 학계와 업계가 동참해야 할 프로젝트”라며 “나는 언제든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며 웃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文대통령 "인사는 인사, 정치적 문제로 국민 희생되는 일 없어야"
- 文 "대입 전형료 과도..획기적 인하안 내달라"
- '남사친 여사친' 고은아-정준영, 익숙한 투 샷 '수영복' 밀착 데이트
- 김민준·설리 4개월만에 결별, 최자와 재결합설? "뭔가 의미심장한 사진"
- 이시영 예비신랑, 조승현 대표는 누구..20대 때 외식사업 시작해 프렌차이즈 히트
- 김도연 기상캐스터 "퇴근 4시간 남아 슬퍼"
- '라디오스타' 조태관 "송중기X송혜교, '태후' 뒤풀이 때 묘했다"
- 이찬오 근황 '청담동 레스토랑 오픈' 송혜교·김희선·송윤아와 인증샷까지?
- 이재용 만난 習…'中, 이상적 투자처'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에 소환 통보…뇌물수수 혐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