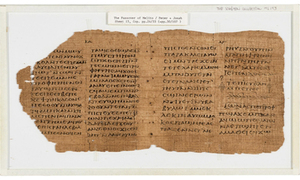변하지 않는 욕망 대변 ‘원더우먼’
맘충 취급 받는 보통 엄마 ‘김지영’
女 향한 그릇된 시선 바로잡아야 유대 신화에서는 아담의 첫 번째 부인이 이브가 아니라 릴리트이다. 탄생의 과정도 사뭇 다르다.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지만, 릴리트는 아담처럼 흙으로 빚어진 독립체였다. 이에 걸맞게 릴리트는 적극적이었고 관능적이었다. 신과 아담 모두 릴리트에게 불만이었고, 릴리트도 그런 그들로부터 도망쳤다. 기독교 문화가 중심이 되는 성경에서는 릴리트가 사라진 이유이다.
페미니즘이 이런 릴리트를 살려냈다. 가부장제를 수용하지 않거나 쾌락을 향유하는 여성의 상징으로 맞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성을 유혹하는 창녀나 어머니가 되기를 거부하는 마녀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늘 덧붙여졌다.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이야기한 ‘이것이 인간인가’의 저자로 잘 알려진 프리모 레비는 단편소설 ‘릴리트’에서 수용소라는 비극적 공간이기에 더욱 치명적이고 잔인한 매력을 지닌 신비하고도 모호한 여성으로 그녀를 등장시킨다.
 |
| 김미현 이화여대 교수 문학평론가 |
원더우먼의 탄생과 성장을 만화 원작자인 윌리엄 마스턴의 전기(傳記)와 연결시켜 흥미롭게 연구한 책 ‘원더우먼 허스토리’에 따르면 원더우먼을 페미니즘의 표상만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원작 만화 속 원더우먼은 남성에 의해 쇠사슬에 묶이면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데, 그런 결박 장면이 나오지 않는 페이지가 거의 없다. 탈출하려면 먼저 묶여야 하고, 거기서 여성들은 쾌락을 느낀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스턴은 두 명의 여성과 그녀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네 명의 자식과 함께 한 지붕 아래 살았다. ‘놀라운’ 페미니스트였다고나 할까.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3년 전 결혼해 딸을 낳은 30대 한국여성 김지영이 주인공이다. 릴리트처럼 살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원더우먼은 영화에서나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지극히 평범한 여성이다. 실제로도 1982년생 여성들 중 가장 많은 이름이 ‘김지영’이란다. 그녀는 그토록 흔한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비범한 일임을 유년기에서부터 청년기를 거쳐 직장 생활과 결혼 및 육아를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실감한다. 아담의 뼈만큼.
이런 현실을 작가는 2001년 여성부 출범, 2005년 여성 채용 비율 29.6%, 2014년 대한민국 기존 여성 중 한 명은 결혼 및 육아로 인해 직장 포기라는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면서 김지영의 상황과 연결시킨다. 왜 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국회에서도 읽히는지 가늠이 되는 대목이다. 육아 문제로 직장까지 그만두고 간만에 공원에서 15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김지영에게 남성들이 하는 말은 이렇다. “나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커피나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싶다…… 맘충 팔자가 상팔자야…… 한국 여자랑은 결혼 안 하려고.”
릴리트는 아담과의 갈등을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했어야 했을까. 원더우먼은 비서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좀 더 주체적이어야 했을까. 김지영은 벌레 취급을 받으면서도 무조건 모성을 신성화했어야 했을까. 이런 잘못된 의구심에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세상이 과연 올까. 그녀들의 ‘허스토리(herstory)’는 우리 모두의 히스토리(history)’다. 이토록 ‘오래된 미래’를, 한 번 보면 21세기인데 두 번 보면 20세기 같은 ‘두 겹의 현재’를, 그녀들은 ‘오답 같은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아닌 정답’을 추구하는 건 여성들만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의무이다.
김미현 이화여대 교수 문학평론가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베르사유 궁 출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6/11/128/20240611517929.jpg
)
![[데스크의눈] 기업 이사회, 주주 신뢰 얻으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20/128/20240220517692.jpg
)
![[오늘의시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차분히 도전하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6/11/128/20240611517873.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부조리극의 성스러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06/128/2024020651940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