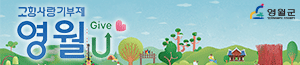|
| 오용분(69) 고성군나잠연합회장이 26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자택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3.26/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
문화재청은 해녀와 관련된 문화가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과 예술성, 고유성 등의 가치가 탁월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종목을 보존·전승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해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녀와 관련된 문화가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특정 보유자나 단체를 인정하진 않지만 해녀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해녀하면 대부분 제주도 해녀를 떠오르기 마련이지만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울산, 부산에서도 해녀들이 활동하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뉴스1은 26일 강원도 최북단 고성군에서 해녀로 살아가고 있는 강원도여성어업인 오용분(69) 고성군 나잠연합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충청도에서 태어나 어릴 적 가정환경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24세에 강원도 고성으로 시집왔다.
한때는 간호사와 경찰관을 꿈꾸기도 했지만 먹고 살기 급급한 환경에 물질을 시작했다.
다음은 오용분 고성군 나잠연합회장과의 일문일답.
- 어쩌다 해녀 일을 하게 됐는지.
▶시집 와서 먹고 살 게 없어 빚도 많이 졌고 굶기를 밥 먹듯 했었다.
바다는 거짓이 없다.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 물질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다. 지역 사람들은 해변가에 살아서 해물에 대해 잘 알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성게가 침으로 찌르면 덧나서 죽는 줄 알았고, 문어를 봐도 못 잡았었다.
처음에는 일반 복장에 운동화를 신고 바닥에 배를 깔아 물 밑을 들여다보며 시작했다. 제주도에서 온 해녀들은 전복도 따고 물질도 쉽게 했다. 당시 육지 해녀들은 물질을 할 줄 몰라 제주해녀들이 고무 옷을 입고 오리발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했다.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익혔다. 제일 필요한 건 인내심이다. 참을성만 있으면 자기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오리발질이 기술이다.
잠수복이 스펀지라 납으로 무게를 조정한다. 들어갈 때 비스듬히 들어가면 물의 압력을 받는다. 똑바로 서면 칼 내려가듯 자동으로 가라앉는다. 물속에서 올라올 때 하늘을 보면 물 먹는다. 그래서 새우등을 하고 올라오는데 알고 보니 이게 잠수 기술이었다.
여러 불편사항들을 느낄 때마다 점차 개선해 나갔다. 작업 도구를 개발하기도 하고 물에서 배에 오를 때는 사다리도 이용했다.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자동으로 하게 되더라.
해녀 일을 하면서부터 형편이 나아졌다. 자녀들 대학교까지 가르치고 돈도 많이 벌었다. 많이 벌 때는 하루 200만원까지도 벌어봤다.
 |
| 사진은 해산물 채취하는 해녀 모습. (문화재청 제공) /뉴스1 |
-해녀 회장으로서 삶을 돌아본다면.
▶70년대에는 미역 등 해산물이 엄청 많았는데도 판로가 없어 팔지 못하고 직접 먹거나 버리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어촌계에 입찰 제도를 건의해 도입하면서 유통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유통 업자를 통해 팔던 해산물을 경매를 통해 팔면서 돈도 바로 벌 수 있었고 수입도 굉장히 늘었다.
이후 대진나잠협회장이 됐다. 해녀일과 대외적인 정치를 하느라 집안일에는 신경 쓰지 못했다.
학력도, 인품도 없는 해녀에게 무기는 전복, 문어, 미역, 다시마 등 해산물이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가는 곳곳마다 나눠주며 맛보라고 홍보하기 바빴다. 못 팔고 버리던 해산물들이 점차 알려지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
해녀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승선 인원제한을 늘리는 데도 힘쓰며 해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다만 회장이 된 이후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게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크다.
회장을 맡으면서 정치, 행정절차, 사업에 대해 알게 됐다. 당시 해녀들은 세무나 행정지식 쪽으로 상식이 없어 불이익도 많이 당했다. 군에서 어민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지만 해녀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안타깝다.
돌아보면 여기(고성) 선택을 너무 잘했다. 위법만 하지 않으면 제지하는 곳이 없어 자유롭다. 근데 해녀를 이어갈 다음 세대가 없다. 배우려고 들어와도 힘드니까 이내 돌아간다. 강원도는 지금 해녀들이 마지막이다. 60~70대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해녀 일이 힘들진 않는지.
▶ 물속에서 하는 일이 힘드니까 이를 악물고 하다 보니 이가 다 망가졌다.
또 위험해서 저승문턱을 왔다갔다 한다. 혈압이 떨어져 피 공급이 안 되면 심장이 아프다.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혈압이 떨어지면 숨이 길어져 마냥 돌아다녀도 숨 가쁜 줄도 모른다. 그러다 죽는다.
나라에서는 해녀들을 위해 ‘챔버’라는 치료 장비를 도입해 무료로 잠수병을 치료해 주고 있다. 치료를 받으려면 강릉까지 가야하는데 거리가 멀어 잘 못 간다.
또 잠수복과 개인 수족관을 지원해줘서 많은 도움이 됐다.
이젠 바다도 예전 같지 않다. 전에는 파도가 쳐도 물 밑은 잔잔했는데 지금은 빙산이 녹아서 그런지 겉은 괜찮아 보여도 물 밑은 사람이 끌려갈 정도로 조류가 심하다.
해녀일도 젊었을 때나 할 일이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 됐다는데 등재되길 바란다. 고성 해녀들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주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직업여성으로서 인정받고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
| 사진은 잠수한 해녀 모습. (문화재청 제공)/뉴스1 |
high15@










![최강희, 김혜자 한 마디에 복귀 결심…대본 검토 중인 근황 공개 [RE:TV]](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6/12/6701950/no_water.jpg/dims/resize/276/crop/276x184/thumbnail/138x92!/optimize)

![뉴진스 민지, 초여름 자체발광 미모...완벽 이목구비 [N샷]](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5/31/6680247/no_water.jpg/dims/resize/276/crop/276x184/thumbnail/138x92!/optimize)
![트와이스 나연, 신보 콘셉트 포토 공개...서머퀸 비주얼 과시 [N컷]](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5/30/6677650/no_water.jpg/dims/resize/276/crop/276x184/thumbnail/138x92!/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