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배의 그림으로 보는 인류학] 미국·프랑스의 동반 번영을 바란 '자유의 여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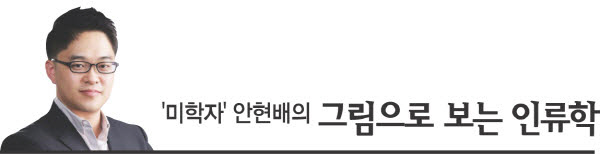
오르세에 들어서면 박물관이라는 인상보다는 어딘가 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은 기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표 검사를 하고 나서 처음 만나는 것은, 뉴욕에 있는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하지만 그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3m 정도 되는 이 여신상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미니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에 있는 것을 만든 오귀스트 바르톨디가 하나 더 제작해 프랑스에 기증한 작품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새로운 미합중국을 세운 지 100년을 기념하는 1876년을 앞두고 프랑스는 분주해집니다. 프랑스는 영국을 상대로 한 미국인들의 전쟁에서 열심히 미국 편을 듭니다. 그리고 1876년은 프랑스 제3공화정이 나폴레옹 3 세 이후 몰락한 제국의 뒤를 이어 신생 공화국으로 들어선 지 얼마 안 되는 때였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동반 번영은 그들에게도 큰 목표였고, 이 조각을 선물하려는 계획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프랑스가 이집트와 협업해 건설한 수에즈 운하 개통 당시 바르톨디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로도스의 등대를 본떠서 수십m의 대형 조각을 운하 곁에 세우려는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그 계획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라불라예 의원이 제안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 이른다. 46m에 달하는 자유의 여신상은 그렇게 태어났다.”
‘국가 지정 조각가’라고 불리던 바르톨디는 손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를 만들 때마다 그 스케일로 다른 이들을 질리게 할 정도였죠.
“바르톨디는 이 대형 여신상의 모델을 상당히 고전적인 모습에서 찾아왔다. 여신상의 얼굴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며, 정적인 동작은 당시 유행과는 조금 다르게 신고전주의 경향에 가까웠다. 워낙 크기가 커서 이 여신상은 모든 디테일이나 자세 등에 제한이 많았다. 그런 제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루함을 바르톨디는 여신상의 손에 다양한 물건을 들도록 해서 활기를 주려고 했다. 불꽃이 표현된 횃불, 법전이 적힌 석판, 노예의 해방을 뜻하는 절단된 쇠사슬 등이 그것이다. 머리에 쓴 관은 교황 클레멘스13세 무덤을 제작할 때 선배 조각가 안토니오 카노바가 만든 ‘믿음의 여신’이 쓰고 있던 왕관에서 영감을 얻었다. 바르톨디는 이 시기 대부분의 국가들이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던 것에 반해 공화국으로서 존재한 미국과 프랑스의 강한 민주주의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그 발전을 기원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고 밝힌 적 있다.”
상당히 근엄하게 생기고 엄숙한 분위기의 여신상이 태어난 것은 제작의 어려움 때문에 동작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유뿐 아니라 뉴욕 맨해튼에 들어서 있는 이 여신상은 그 자체로 미국의 거대하고 힘있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여신상을 만들 때 내부에서 이 조형물을 받쳐주는 철골 구조의 제작이 어려운 과제였는데, 바르톨디는 그 작업을 19세기 후반 최고의 엔지니어인 구스타프 에펠에게 1866년 맡겼다. 오르세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작가가 직접 제작한 축소 판이다. 오르세는 19세기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 조각이 전시되는 것을 바랐다.”
바르톨디 사망 후 부인은 이 조각이 국가에 기증되고 나아가 국가 지정 소장품이 되길 남편이 바랐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전해진 원래 조각과 별도로 이 작품이 오르세의 한쪽을 지키면서 미국에 선물한 프랑스의 정치적 선물을 회상하게 합니다.
미술사학자 안현배는 누구? 서양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가 예술사로 전공을 돌린 안현배씨는 파리1대학에서 예술사학 석사 과정을 밟으며, 예술품 자체보다는 그것들을 태어나게 만든 이야기와 그들을 만든 작가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와 언어의 다양성과 역사의 복잡함 때문에 외면해 오던 그 이야기를 일반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술사학자>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경X초점] “씨X·개저씨” 민희진 기자회견, 뉴진스에 도움 됐을까
- 김갑주, 5개월 만에 맥심 표지 모델···‘큐티+섹시’ 순종 아내 변신
- [전문] ‘사기 의혹’ 유재환 “실망·상처 남겨 죄송…금전 피해 고의 아냐”
- [전문] 폴킴, 품절남 된다···손편지로 결혼 발표
- “인사 안 한다고 쌍욕→실내 흡연”…유노윤호 저격한 前 틴탑 방민수
- “김지원, 10분 내로 기억 찾자” 스페셜 선공개도 답답한 ‘눈물의 여왕’
- ‘선우은숙 언니에 성추행 피소’ 유영재, 자살 암시···정신병원 긴급 입원
- ‘수사반장 1958’ 뜨는 이유 셋
- [공식] ‘눈물의 여왕’ 박성훈, 유퀴즈 출연 확정
- 김지은, 첫 사극 도전···성장 로맨스 ‘체크인 한양’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