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자수첩용 정혜윤 |
정부가 성과연봉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선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연초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독려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도 동시에 준비했다.
제도의 충실성 등을 평가해 기본월봉의 10~30%가 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인센티브였다면 내년도 총인건비 동결은 패널티였다.
그 결과 5개월 만에 ‘성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6월 30개 공기업, 90개 준정부기관 등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9월 들어 노사갈등은 커지고 있다. 금융산업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잇따라 ‘성과연봉제’를 명분으로 파업에 나섰다. 정부도 달래기보다는 맞서고 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부분 기관에서 (성과연봉제 조기이행)성과급을 수령해 갔다"며 "이는 암묵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률은 57%다. 조기이행 인센티브 대상기관인 113개 중 75개에 그친다. 이중 10개 기관은 노조의 반대로 성과급을 보관중이다. 나머지 38개 기관은 재원 여력이 없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줄 수 있다.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잡음은 기본적으로 '노사합의'에 관한 입장 차이에서 생긴다. 정부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 반면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근로기준법과 노사관계법상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요건'에 해당하는 만큼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없다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120개 기관 중 50개 기관은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것은 정부의 성과를 내기엔 좋았다. 그러나 초기부터 우려했던 사안들이 조금씩 불거지고 있다. 방향성은 옳았다고 해도 정부의 '성과'가 진정한 '성과'가 되기엔 조금 부족했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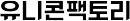
























![[속보]이복현 사의표명 "금융위원장께 제 입장 말씀드렸다"](https://thumb.mt.co.kr/11/2025/04/2025040208241412381_1.jpg/dims/resize/100x/optimize/)

![[단독]더본코리아, 'M&A' 매물 노랑통닭과 접촉···"시너지 대상 검토중"](https://thumb.mt.co.kr/11/2025/04/2025040214174477175_1.jpg/dims/resize/100x/optim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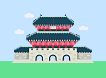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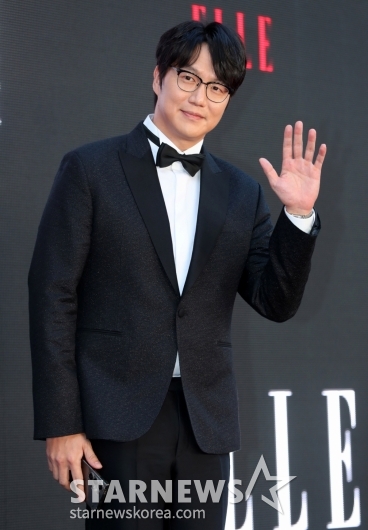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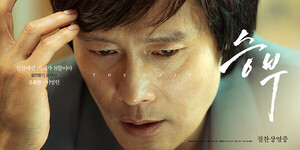









![주진우 "이재명 선거법 2심 형량, OOO 예상…조기대선 열려도 확장성에 한계"[터치다운the300]](https://i1.ytimg.com/vi/PfQC-0KVTzU/hqdefault.jpg)
![중국이 미얀마에 공들였는데 골칫거리가 된 코캉 [DonQ 편집장의 미국 대 중국]](https://i1.ytimg.com/vi/LPoTfC8caD8/hqdefault.jpg)
!["이낙연은 성급했다, 이재명에게 할 조언은..."김부겸이 바라본 탄핵정국[터치다운the300]](https://i1.ytimg.com/vi/XQCIvmPipFQ/hqdefault.jpg)




!['해적'과 '악동', 일론 머스크의 '화성 정복'의 꿈을 설명하는 키워드 [DonQ 편집장의 미국 대 중국]](https://i4.ytimg.com/vi/GYkGC6b1118/hqdefault.jpg)
![김태년 "문모닝 하던 국민의힘, 이제는 명모닝...이재명만 찾다간 필패"[터치다운the300]](https://i2.ytimg.com/vi/YFL30LR1RRE/hqdefault.jpg)
![부산, 북극항로의 최고 요충지로 열강의 타겟이 될 것[DonQ 편집장의 미국 대 중국]](https://i1.ytimg.com/vi/phdvUDIWKQ8/hqdefault.jpg)
![이건태 "헌법재판소, 장담컨대 '윤석열 탄핵 기각' 결정문 쓸 수 없을 것"[터치다운the300]](https://i1.ytimg.com/vi/PXy1sPAoI08/hqdefault.jpg)




![정성국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 가장 먼저 할 말은? ...'尹 배신자 프레임', 이렇게 해결 가능" [터치다운the300]](https://i3.ytimg.com/vi/fb3HnFFMCXU/hqdefault.jpg)
![이준석 "이재명, 조기대선 후보직 박탈될 수도...맞붙고 싶은 여당 상대는 OOO"[터치다운the300]](https://i3.ytimg.com/vi/vqVgcCfuxXM/hqdefault.jpg)
![지지율 급상승한 젤렌스키, 트럼프의 안전보장 약속 받아 낼까 [DonQ 편집장의 미국 대 중국]](https://i1.ytimg.com/vi/DaORMfdYqK0/hqdefault.jpg)
!["도주원조죄, 내가 찾아냈다...윤석열 대통령, 개인 아닌 권력기관" [터치다운the300]](https://i4.ytimg.com/vi/sL2Wc-4dN8w/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