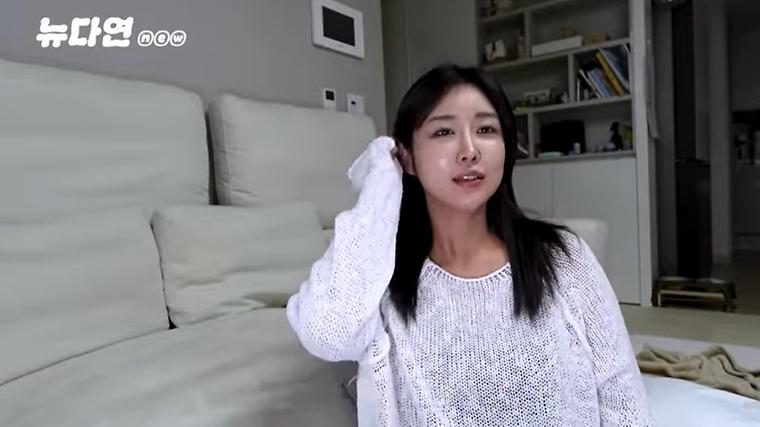버냉키·스티글리츠 "재정정책 함께 취해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통화정책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6일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 등 일본 고위층을 만나 "통화정책은 이제 수명이 다해간다"고 말했다.
강력한 효과를 냈던 BOJ의 통화완화 정책은 더 이상 약발이 먹혀들지 않으면서 이전 성과를 모두 까먹고 있고,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통화정책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QE)가 그나마 가장 나은 성과를 보였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는 데다 추가 경기둔화에 직면할 경우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버냉키 전 의장이나 스티글리츠 교수 등 전문가들의 처방은 같다. 재정정책이 함께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버냉키 의장은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보다는 "통화·재정 대응이 균형을 잡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ECB나 BOJ가 이미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NIP)은 '완만한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어 연준이 계속 연구해봐야 하겠지만 도입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도 지난주 아베 총리 등 일본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재정정책 병행과 소비세 인상 연기를 권고했다. 그는 NIP가 경제성장을 자극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BOJ의 자산매입 프로그램(QE)은 불평등을 높이고, 어떤 의미 있는 투자증대를 유발하는 데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BOJ의 통화정책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곳곳에 널려 있다고 전했다. 우선 BOJ의 경기부양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인 엔저(엔화 약세)가 실종됐다는 점이다.
엔은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긴축 고비를 늦출 것임을 시사한 18일 급등했다. 구로다 총재가 2014년 10월 개시한 2차 QE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가치가 뛰었다.
경제는 다시 고꾸라지는 모습이다.
엔저 효과가 사라지면서 기업 순익은 감소하고 있고, 도쿄증시는 지난해 6월 최고치 대비 20%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약세장이다. 또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은 제로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인플레이션 지표는 구로다 총재가 취임한 2013년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BOJ 내부에서도 세차례 후퇴하며 2017년 후반으로 늦춰진 2% 인플레이션 도달 목표시기가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기 시작했다.
엔저가 기업 순익을 끌어올리고 임금인상과 이에 따른 자가순환하는 소비, 성장의 '선순환'을 이끌어낸다는 구로다 총재의 구상이 실현 불가능해지는 양상이다.
일본 정책담당자들도 이제는 통화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SJ는 최근 아베 보좌진이 총리에게 재정정책 필요성과 소비세 인상 연기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정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우선 유럽은 2010~2012년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적이 있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돈을 풀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 가운데 재정이 탄탄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은 이 같은 경기부양에 반대하고 있어 돈 나올 곳이 없다.
일본은 잘 알려진 대로 세계 최대 채무국 가운데 하나다. 재정정책을 위해 국채를 더 발행하면 자칫 채무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 아베 총리도 이 점을 우려해 재정정책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미국도 재정정책을 병행하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다수당인 공화당이 반대할 것이 뻔한 데다 특히 지금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책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