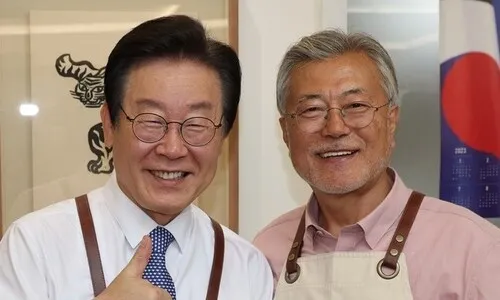1961년 8월23일, 광주 송정고등공민학교로 첫 발령을 받아 교단생활이 시작되었다. 전라남도는 섬이 많은 지역이라 첫 발령은 멀리 낙도의 학교로 날 가능성이 많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광주 외곽에 있는 학교여서 거동 못하시는 어머니 병구완을 해야 하는 나로서는 무척 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한여름 폭염 속의 부임 첫날, 나는 결혼식 때 입었던 겨울 치마에 반팔 셔츠를 입고 출근해 인사를 했다. 교사로 취직이 됐건만 제대로 된 정장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가난한 살림살이였다.
그때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고등공민학교는 초등학교나 공민학교를 졸업했지만 중학교 진학을 못한 청소년과 일반인들을 위해 설치된 보통교육 보조기관이었다. 1949년 교육법에 따라 설치됐지만 학력 인정은 되지 않았다. 우리 학교에는 광주 인근부터 멀리 농촌지역에서까지 집안형편이 어려워 정규학교를 가지 못한 학생들이 다니고 있었고, 대부분 나이도 많은 편이어서 19살 먹은 학생도 있었다. 내 나이 26살 때였다.
좁은 교무실에서 10여명의 교사들이 근무했는데, 나는 수학 과목과 함께 첫 담임으로 중학교 3학년 여학생반을 맡았다.
그해 12월 말 둘째 아들(정규욱)을 낳았다. 임신 내내 하루 한끼 겨우 먹었던 까닭에 아이는 뼈밖에 없었다. 당연히 영양부족이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처음으로 출산수당이 나왔다. 당시 교사 월급은 형편없던 때였다. 더구나 나는 초임인데다 정교사가 아닌 준교사여서 더더욱 열악했는데 그 전에는 없었던 월급만큼의 출산수당이 나와 신기할 정도였다. 주위에서도 ‘아이가 복이 있구나’ 하며 축하해 주었다.
그때도 법으로 출산휴가 두 달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무렵 여교사들은 출산휴가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지금처럼 출산휴가 동안 기간제 교사가 채용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출산으로 인한 수업 공백을 같은 교과 선생님들이 해결해야 했다. 그래서 출산을 앞둔 여교사들은 다른 선생님들에게 미안해서 아이 낳기 전날까지 근무하고 출산 후에는 한 달 정도 겨우 쉬는 상황이었다. 몸이 몹시 좋지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두 달을 모두 쉴 수 있었다.
이듬해에도 3학년 여학생반 담임과 함께 도서계를 맡았다. 그때는 사서교사 제도는 없었고, 업무상 도서계로, 대부분 국어과 선생님들이 맡았는데 신출내기이자 수학과인 내게 도서계가 맡겨져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고등공민학교인지라 제대로 된 도서실도 없고 교무실 한쪽에 책장이 있는 정도였지만 속으로 ‘내가 책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하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맡았다.
그런데 5월이 되자 모내기 지원 활동을 나가게 됐다. 농촌 일손이 모자라니까 학교와 면 단위를 연결해 정해진 날 학생과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가서 모내기를 돕던 시절이었다. 처음엔 학교 전체가 함께 가는 줄 알았는데 직원회의 때 짜인 계획을 보니 학급별로 흩어져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었다. 도시에서만 나고 자란 나로서는 내심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모를 구경한 적도 없었고, 심어본 적은 더더욱 없었던 터였다. 학교 전체가 같이 가면 다른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회의가 끝나자마자 우리 반 반장과 부반장을 불러서 의논을 했다. “며칠 뒤 모내기 봉사를 하러 가는데, 우리 반은 따로 평동면으로 가게 됐다. 그런데 선생님은 모를 한번도 안 심어봤는데 어떻게 하냐?” 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랬더니 반장 옥자가 “염려 마세요, 선생님. 우리는 다 심어봤어요.” 하는 것이었다. “아! 너 심어봤어?” “그럼요. 우리는 다 심어봤어요. 우리 반에 모 심을 줄 아는 애들 많아요. 선생님, 염려 마세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너희들만 믿는다!” “염려 마세요.” 아이들은 별일 아니라는 표정으로 답했지만 나에게는 구세주가 따로 없었다. 그 순간만큼은 아이들이 나보다 훨씬 어른스럽게 보였다. 전 전교조 위원장(구술정리 이경희)


![[속보] 서부지법 방화 시도 ‘투블럭남’ 10대였다…구속 기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124/53_17377092089303_20250124502686.webp)









![[포토] 미 서부 초대형 산불과 사투 벌이는 소방관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124/53_17376993145569_20250124502184.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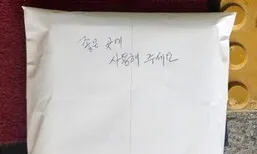








![[단독] 백해룡의 폭로… 검찰 마약수사 직무유기 정황 포착](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4/1219/53_17345612070559_20241219500167.webp)

![[사설]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자경단’, 왜 이런 일이 사라지지 않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124/53_17377111829688_20250124502700.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경찰 ‘전광훈 전담팀’ 꾸렸다…법원 난입 연관성 수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50/510/imgdb/child/2025/0124/53_17377081513685_20250124502655.webp)